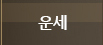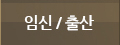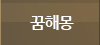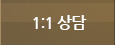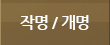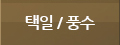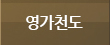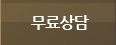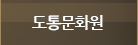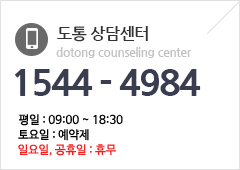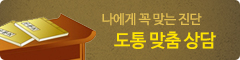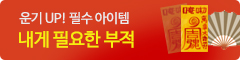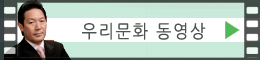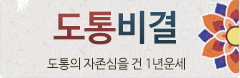문화칼럼
| 작성자 | dotong | ||
|---|---|---|---|
| 독도엔 대나무는 없다.... | |||
|
이름따라 운명따라...
사람의 이름이든 어떤 지역의 지명(地名)이든 그냥 아무렇게나 붙여진 이름은 없다. 사육신(死六臣)의 한 분인 성삼문(成三問, 1418∼1456)은 한자 이름에서 보듯이 세 번 물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성삼문의 어머니가 만삭(滿朔)이 되어 친정에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역(易)에 밝으신 친정 아버지(성삼문의 외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태어날 시(時)가 좋지 않으니 어떻게 하든 출산을 좀 더 늦추라고 말렸다. 친정 어머니가 출산을 막으려고 산모의 자궁(子宮) 앞에 다듬이 돌을 막고서 기다리다 묻기를 세 번, "지금이면 됐습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아이가 나오고 말았는데, 그 아이가 훗날 성삼문(成三問)이다. 세 번을 묻고 나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억지로라도 좀 더 출산시간을 지체하여 늦게 나왔다면 서른 아홉의 이른 나이에 죽지 않고 천명(天命)을 다할 수 있었을까? 고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 '10월 유신'이라는 변혁을 계획하면서 당대의 유명한 역술인을 찾아 물었다. 시월 유신(維新)이 성공하겠습니까? 하고 물었단다. 그랬더니 역학자인 유명한 박도사 제산(霽山) 박재현(朴宰顯)선생은 유신(維新)을 하면 유신(幽神)이 된다 했단다. 유신(幽神, 그윽할유 귀신신), 곧 저승의 귀객이 된다는 말이다. 박도사는 그 후 모진 고초를 당했음은 물론이다. 결국 박정희는 총탄을 맞고 유명(幽冥, 저 세상)에 들었다. 인천 국제공항이 자리하고 있는 영종도(永宗島)의 본래 이름은 제비섬이었다. 영종도(永宗島, 길영 마루종 섬도)란 긴 마루처럼 섬이 넓고 길게 펼쳐진 곳이란 이름이다. 그리고 이 영종도는 옛부터 제비가 많이 날아들어 제비섬으로도 불렸다.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길조(吉鳥)의 제비가 긴 마루 위를 나는 곳이니 이 영종도(永宗島)는 이미 공항의 비행장이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최근 일본이 우리의 독도(獨島)를 자꾸만 대나무섬 죽도(竹島, 다께시마)라 우긴다. 일본 정치인 몇 명이 울릉도에 가겠다고 우기다가 결국 공항에서 비빔밤 사먹고 김 싸들고 돌아갔다. 독도는 정광태씨의 노래에도 나온다. "경상북도 울릉군 도동산 육십삼♪♬∼ 동경 백 삼십이 북위 삼십칠........지증왕 십삼년 섬나라 우산국 세종신록 지리지 50페지 3째줄.....하와이는 미국땅 대마도는 몰라도 독도는 우리땅∼♪ 독도는 '돌섬'을 뜻한다. 지금도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를 '독섬', 또는 '돌섬'이라 부른다. 이렇게 독도는 돌이 많은 작은 섬이라 하여 한자어로 독도(獨島)라 이름 붙여졌다. 이 독도에는 갈매기 끼륵 끼륵 파도는 철썩 철썩 하지만...... 일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대나무는 한 그루도 없다. 죽도(竹島, 다께시마)는 말도 되지 않는 택도 없는 소리다. 며칠 전 장래 변호사를 희망하는 중학생을 둔 아버지께서 딸의 개명을 의뢰했다. 본명이 '다빈'이었는데, '다 비었다'는 말이 영 거슬렸다고 말씀하셨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부모님과 또 착한 따님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개명(改名)을 하도록 흔쾌히 승낙을 했다. 우리말에 유명무실(有名無實)이란 말이 있다. 이름만 있고 실체(實體)가 없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거짓이나 속임수 또는 허풍 등에 쓰이는 말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도 늘 가려서 해야 하고 또 이름을 지을 때도 심사숙고해서 지어야 한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도 있다. 말이나 이름의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바위섬 독도에 대나무가 심겨질 일은 없을 터, 독도(獨島)는 언제나 굳건한 돌처럼 오늘도 거기 또 그렇게 서 있다. <<문화칼럼, 地山 識> 이름 따라 직업을 택하게 된 사연의 신문기사가 있다. 아래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관련기사 보기.... |
|||
| 2018-04-1202:58 | 조회:2681 | |||